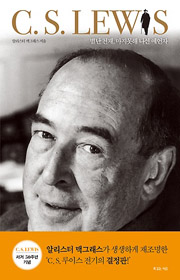 |
최근 출간된 복있는사람의 「C. S. Lewis(복있는사람)」
우리나라엔 3권의 C. 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전기가 있다. 루이스 자신이 쓴 <예기치 못한 기쁨(원제 Surprised by Joy)>, 제자이자 친구인 조지 세이어(George Sayer)가 쓴 <루이스와 잭(원제 Jack: a life C. S. Lewis·이상 홍성사)>, 이번에 출간된 「
‘별난 천재, 마지못해 나선 예언자’라는 부칭도 있는 이 책(원제 C. S. Lewis-A Life: Eccentric Genius, Reluctant Prophet)은, 과학과 신학에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는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썼다.
세 권의 전기를 간단히 평해 보자. <예기치 못한 기쁨>은 거실 소파에 앉아 루이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다.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어도 괜찮다. 표정이며 말투, 대화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루이스가 생략을 했거나, 배경 지식이 없는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음성을 듣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또한 이 자리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루이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듣는 시간이다. 루이스 애독자로서, 루이스 전기가 100종이 나올지라도 언제나 1순위는 이 책이다.
<루이스와 잭>은 루이스의 목소리를 듣되, 문 밖에서 듣는다. 또한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따라서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누구의 목소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가끔 억양이 드러나거나 목소리가 고조될 때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아채며 ‘으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표정이나 말투, 분위기를 가늠하기가 <예기치 못한 기쁨>보다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루이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
|
▲왼쪽부터 <예기치 못한 기쁨>, <루이스와 잭>.
|
루이스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학자의 전기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다. 말을 써놓고 보니 학자들이나 쓰는 표현 같다. 내 식대로 표현하자면, 루이스나 친구들은 궁금해 하지 않지만 나같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궁금해 했을 질문을 조목조목 풀어주니 참 고마웠다.
아일랜드 태생인데 왜 잉글랜드 학자로 불리는지, 트리니티 학기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루이스의 스승 커크패트릭이 28세에 교장이 되었다는 것, 옥스퍼드 학부시절 같은 칼리지에 C. S. Lewis가 한 명 더 있었다는 사실, 책 중간에 ‘한국전쟁’이 언급된다는 것, 루이스의 무덤에 있는 글귀는 와니(루이스의 형)가 선택했다는 것, 무어 부인은 기독교에 적대적이었다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에 눈이 갔다.
그리고 정이 갔다. 왜 팬들이 아이돌그룹의 사생활까지 캐려 하고, 전에 알지 못했던 스타의 초등학교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해 하는지 이제 나도 안다. 루이스를 통해 이런 감정들이 결코 저급한 것이 아니며, 천국에서 완성되고 충족될 것도 알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생활을 알게 되는 날,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생활을 서로에게 전해주느라 천국은 온통 스포츠와 춤과 노래로 가득한 잔칫집이 될 것이다.
“자기만이 목격한 광경을 다른 모든 영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각 영혼의 시도는 계속 성공을 거두면서도 결코 완료되지 않는 시도로서,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들로 창조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이 데이빗먼이 ‘꽃뱀’이었다니, 그럼 영화 <섀도우 랜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황혼에 찾아온 운명적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던 비운의 남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그 때 누렸던 행복의 일부이다”는 엔딩 대사의 이면에,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던 꽃뱀과 어리숙하게 코가 꿴 영국 교수가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병상 결혼식을 집전했던 신부님도 병자에게 안수하러 왔다가 얼떨결에 결혼예식을 집전했단다. 루이스의 무리한 요구에 소속 교파의 규율도 어기면서 말이다. ‘별난 부부, 마지못해 나선 집전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길은 두 갈래다. <섀도우 랜드>보다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떨어지느냐. <인간 폐지>의 한 문장이다.
“아이들은 그런 광고에 영향 받지 않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은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광고의 수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 수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 진정한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나 대서양을 단지 수백만 톤의 차가운 소금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바지 입은 원숭이들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섀도우 랜드>가 다소 과장해서 만들어준 드라마에 코를 꿰지 않을 두 가지 방법은 첫째, 아래로 내려가는 거다. ‘영화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치부하는 거다. ‘바지 입은 원숭이’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어째든 현실적인 방법이다. 둘째,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꽃뱀과 어리버리의 사랑은 불순하게 시작됐지만, ‘에로스가 없을 때에도 에로스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끝까지 성실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들의 사랑은 영화처럼 낭만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음악이 깔리는 영화의 병상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킬른스의 침상를 지켰다는 것. 사랑에 빠진 이들이 과거의 역사를 색칠해 가듯, 그렇게 과거를 색칠했다는 것. 사랑의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이 채색은 결코 위선이 아니라는 것.
저자가 이 글을 보면, 그렇게 공을 들인 ‘루이스의 회심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걸로 서운해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난 ‘1929년 회심’을 ‘루이스가 1929년이라고 헷갈렸던 회심’으로 기억하게 됐다. 루이스 애독자로서 이 작업에 높은 점수를 주지만, 점수를 매긴 후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둘 일이 아닌 걸 어쩌랴. 이건 저자도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친절하지 않지만 루이스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예기치 못한 기쁨>을, 루이스를 잭이라 부르는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루이스와 잭>을, 앞의 두 책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시시콜콜한 사실까지 알고 싶으면




 More
More















